기사상세페이지
<김주완 교수의 아침산필 (3)>
낡음과 새로움
낡은 것은 버려진다. 낡은 자동차는 폐차장으로 가고 낡은 가구는 폐품으로 처리된다. 쓸모가 없어지고 거추장스러워졌기 때문이다. 쓸모가 없어졌다는 것은 실용성이 없어졌다는 말이며 거추장스럽다는 것은 부담만 된다는 뜻이다. 사물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제도, 인습 또한 마찬가지이다. 묵은 것은 가고 새것이 온다. 세상 이치가 그러하다. 새것은 신선하고 새것 앞에서는 설렘이 소용돌이친다. 낡은 것을 위해서는 한 푼도 지불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새것을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인생이라도 걸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새것만이 지고한 것인가? 새것은 모든 면에서 새로운 것인가?
모든 낡은 것은 처음부터 낡았던 것이 아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쓰이고 또 쓰임으로써 낡아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것이 낡은 것이 된다. 새것과 낡은 것은 하나의 개체가 개체로서 거쳐 가야만 하는 과정이다. 영원히 낡지 않는 어떤 것도 없고 새것인 때가 없었던 어떤 것도 없다. 낡았다고 해서 반드시 비가치인 것만도 아니다. 골동품이나 고색창연한 문화재는 새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것은 희소성의 가치이다. 그러니까 구분의 기준이 달라진 것이다. 새것과 낡은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성질이다. 골동품인가 잡동사니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희소성이다. 기준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새것도 낡은 것이 되고 낡은 것도 새것이 된다.
새것이라고 해서 모든 면에서 새로운 것은 아니다. 갓 출고된 최신형 자동차의 첨단 디자인도 복고적일 수 있다. 그 경우 첨단 디자인은 이미 낡은 것이다. 젊은 날 번개처럼 영혼을 감전시키며 첫눈에 들어온 참신한 여인도 이미 다른 사람의 연인으로서 그 사람과 열렬히 사랑에 빠져있는 남의 여자일 수 있다. 낡은 것이라고 해서 모두가 낡은 것은 아니다. 평생을 같이 산 아내에게서도 어느 날 신선한 모습을 문득 보게 되는 수가 있다. 새로운 사랑이 소록소록 되살아나는 수가 있다. 먼지 쌓인 고문서에서도 반짝이는 진리를 찾아낼 수가 있다. 모든 것은 낡음과 새로움이라는 양면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낡음과 새로움이라는 이원구도 속에서 현대적 소시민의 삶을 처연하게 해명해내는 시가 있다. 한국문협칠곡지부 회장인 송필국 시인의 <낡음에 대한 사색>이라는 시가 그러하다.
동그란 적외선 불빛 망원 렌즈
조준경 속
가로세로 그인 빗금
맞닿은 작은 공간
개울가
물을 마시고 돌아서다 설핏 본
외로 뜬 눈알 하나 심장바닥에
와 박히는
악몽에 가위 눌려
뒤채이다 눈을 뜨면
희나리 찢겨지듯
날이 선 매미소리
시뻘건
쇠창살 넘어 엇각으로 날아들고
눈도 귀도 가리운 털북숭이
삽사리
일그러진 밥통에
턱을 괴고 졸다가
부르르
갈기를 털며 제 꼬리만 물고 돈다.
― 송필국, <낡음에 대한 사색 - 개꿈> 전문
이 시의 제목은 <낡음에 대한 사색>이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꿈과 현실을 이원구도로 대비시킴으로써 낡음을 성찰하면서 새로움을 대두시키고 있다.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낡음은 낡음 그 자체로서 규정될 수 없고 새로움을 대척점으로 해야만 해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념적으로만 보았을 때 낡음과 새로움은 양 극단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았을 때의 그것들은 절대적 대립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연관개념이 된다. 새로운 것과 비교했을 때 낡은 것은 낡은 것이 되고 낡은 것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것은 새로운 것이 된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낡은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새로운 것도 없는 것이다.
이 시에서, 꿈은 새로움이고 현실은 낡음이라는 등식이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니다. 꿈에도 낡음과 새로움이 공존하고 있고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적외선 총의 망원렌즈 조준경은 익숙한 사물이다. 실물을 보지 못한 자라고 하더라도 영상물을 통해서 이미 그것을 본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빗금 구석에 개울이 있고 그 개울물을 마신다는 것은 신선하다. 심장바닥에 와서 박히는 외로 뜬 눈알 하나를 설핏 보는 일은 무서운 악몽임에 분명하다. 악몽은 악몽인데 신선하다. ‘심장바닥’과 ‘외로 뜬 눈알’을 메타포나 상징으로 읽었을 때 우리의 상상력은 무한하게 확장된다. 시의 화자는 가위 눌려서 낮잠에서 깨어난다.
꿈에서 깨어나 바라보는 현실은 한여름 낮이다. 매미소리와 쇠창살에 갇힌 삽사리는 새로울 것이 없다. 흔히들 눈에 띄는 사물들이다. 그러나 시인은 자유와 구속이라는 대립구도를 설정함으로써 새로운 시적 메시지를 강렬하게 제시하고 있다. 매미는 자유를, 쇠창살 속의 삽사리는 구속을 상징한다. 화자는 매미의 소리도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희나리 찢겨지듯 날이 선” 소리라고 한다. 자유의 가치를 모르면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의 각박함을 말하는 것이다. 녹이 슨 쇠창살 너머로 날선 매미소리가 스며들지 않고 날아드는 것을 화자는 ‘엇각으로’ 날아든다고 본다. 직각으로 날아들지 않고 엇각으로 날아드는 것은 비스듬히 스쳐 지나감을 의미한다. 구속되어 있는 자에게 자유는 피상적인 것이다. 삽사리는 이중적으로 구속되어 있다. 우선 쇠창살 속에 갇혀 있고 자기 자신 속에 갇혀 있다. 자기 자신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은 찜통더위에 털북숭이로 살아야 하는 자신의 신세를 의미한다. 삽사리는 “일그러진 밥통에 턱을 괴고 졸다가 부르르 갈기를 털며 제 꼬리만 물고 돈다.” 삽사리의 밥통은 반듯하지 않다. 이리 찍히고 저리 부딪쳐서 일그러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삽사리는 거기에 의존하며 생명을 부지할 수밖에 없다. 폭염 속에서 삽사리는 쇠창살에 갇히고 털북숭이에 갇혀서 허덕거리면서도 선 낮잠을 잔다. 자기 체념적 안주에 익숙해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갈기를 털면서 일어나서는 제 꼬리만 물고 맴을 돈다. 개미 쳇바퀴 돌듯 삽사리는 모든 외적인 것들을 외면한 채 되풀이되는 자기인과성에 붙들려 있는 것이다. 삽사리의 삶은 바로 현대 소시민의 삶이다. 이중 삼중의 구속을 받으며 이미 자유를 망각해 버리고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만 돌리면서 핍진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소시민들의 초상이 바로 삽사리인 것이다. 털북숭이 삽사리도 꿈을 꾸었을까? 삽사리의 꿈에 대해서 시인은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부제를 ‘개꿈’이라고 붙여두고 있다. 개꿈은 화자가 꾼 꿈이라는 것이 문면에 나타나 있다. 전반부에서는 화자가 꾼 악몽을 묘사하고 있고 끝 연에서는 삽사리의 졸음과 깨어남만을 묘사하고 있다. 시인은 악몽(꿈)과 개의 연결을 통하여 개꿈을 이야기 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어쩌면 시인은 현대인의 삶을 자조적으로 풍자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이 시는 낡음과 새로움이라는 주관적 의식을 객관적 사물들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악몽, 매미, 삽사리 등은 객관적 사물로서의 보조관념이다. 구속이라는 본래성을 가진 삶은 새로울 것이 없는 낡은 것이다. 그러나 악몽에서 깨어난 화자가 삽사리를 통해서 현대 소시민의 삶을 관조해 낸다는 것은 참신하다. 부제도 ‘개꿈’이다. 이상을 그리는 꿈이 아니라 어수선한 꿈이다. 정리되지 않는 혼란스러움이다. 시인은 이 시를 통하여 독자로 하여금 현대 소시민의 자화상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는 것이다. 처절한 자기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강요가 아니라 독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는 성공적으로 형상화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낡음과 새로움은 시각의 문제이고 관점의 문제이다. 하나의 사물이나 사태는 낡음과 새로움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우리가 낡은 측면을 보면 낡은 것이 되고 새로운 측면을 보면 새로운 것이 된다. 낡은 것도 새롭게 보면 새로운 것이 되는 것이다. 사물과 사태를 끊임없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자가 시인이다. 시인은 익숙해진 관점을 기피한다. 식상하고 진부한 시각을 거부한다. 시인은 개성적이며 창의적인 시각으로 자기만의 시점(視點)을 확보하여 시를 빚는다. 그렇게 만들어진 시를 독자들은 읽으면서 산뜻함을 느끼게 되고 새로운 진리를 깨치게 된다. 한 편의 시가 가진 이러한 신선함도 많이 읽히게 되면, 많이 인용되고 회자되게 되면 보편성과 일상성으로 흐르게 됨으로써 진부해진다. 그러므로 시인은 그의 전 생애에 걸쳐서 새로운 관점을 끊임없이 바꾸어 가지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혜성 같은 신인들이 대를 이어 나타나곤 한다. 시와 시인이 만들어내는 순환론적 구조가 그러하다.
<약력>

칠곡 왜관 출생
왜관초등(47회) / 순심중(17회)
시인(구상 선생 추천으로 1984『현대시학』등단)
철학박사 / 대구한의대 교수(현)
구상문학관 시창작교실 지도강사(현)
구상문학관 시동인 ‘언령’ 지도교수(현)
대한철학회장 / 한국동서철학회장/새한철학회장
- 칠곡군민을 위한 실시간 뉴스채널 www.cginews.net -
기사제보/광고문의/취재요청 cginews@hanmail.net ☎011-531-4447
<칠곡인터넷뉴스는 전국지역 90여개의 인터넷언론사와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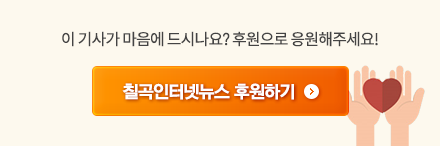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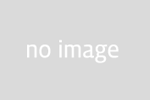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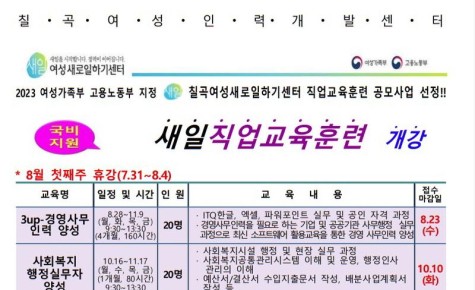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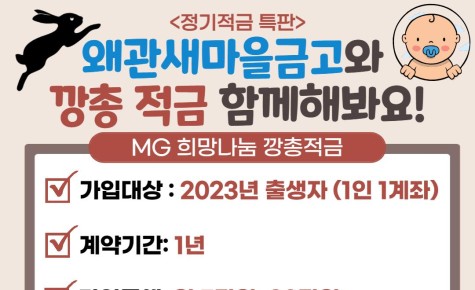
게시물 댓글 0개